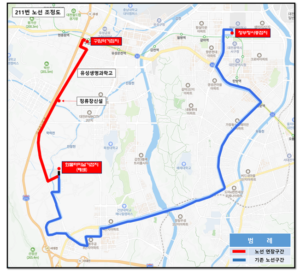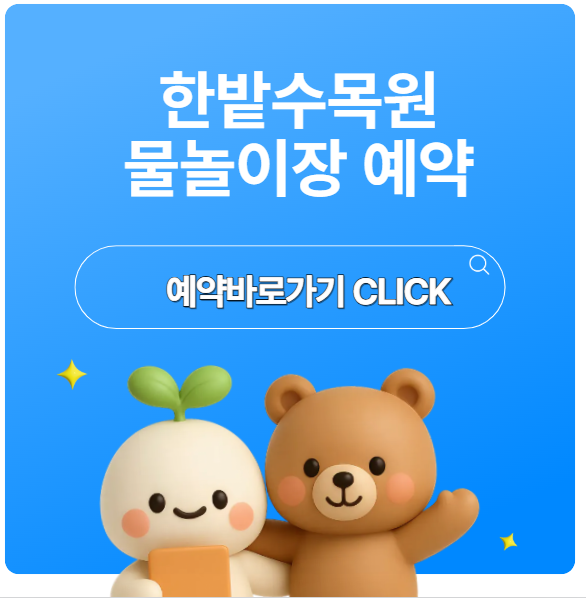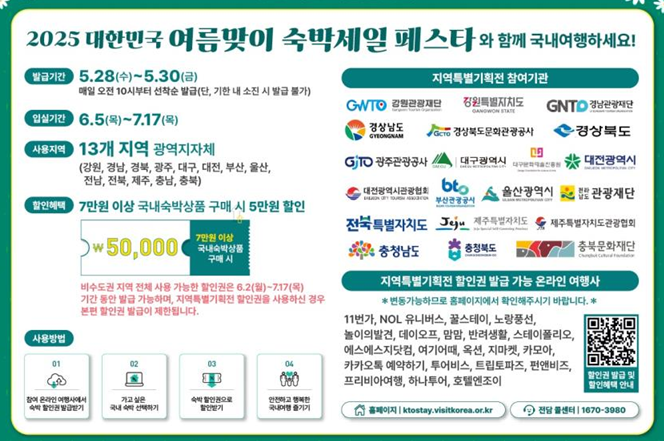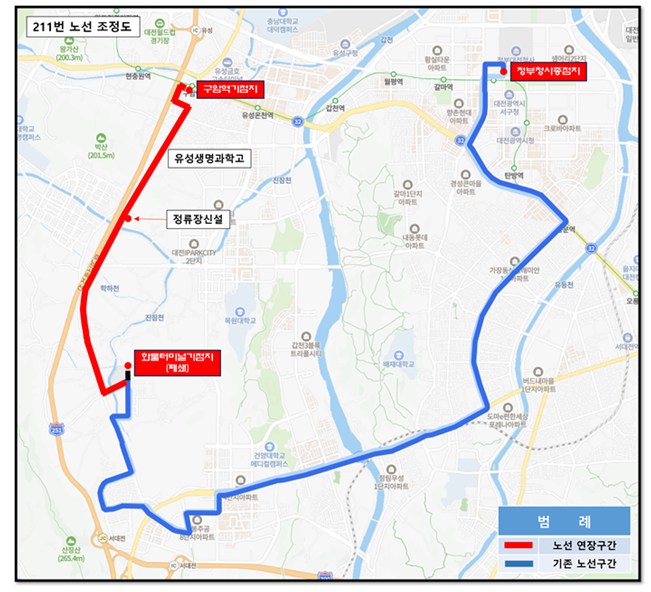새콤하고 시원한 오이냉국은 여름 밥상의 단골손님이다. 찜통 같은 더위와 긴 장마에 집 나간 입맛도 오이냉국 한 사발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돌아온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풋풋한 향이 매력적인 오이는 새콤한 식초를 만나면 천하무적 여름 메뉴가 된다. 식초는 여름을 대표하는 조미료다. 우리나라에 전통 식초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선이 만년에 편찬한 <산림경제>에는 “반쯤 익은 대추를 항아리에 담가 여러 날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맑은 술을 붓고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넣고 대추초를 제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추를 발효한 식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냉국은 더위를 식혀주는 찬 음식이란 뜻을 담아 ‘찬국’이라 했는데, 간혹‘창국’이라고도 표기했다. 1924년 위관 이용기가 한식 고유의 조리법을 소개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도 ‘외창국’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어린 외를 씻어 꼭지를 딴후에 얇게 채를 치고 장과 초와 파와 자총이를 채 쳐한데 넣은 후에 고춧가루를 넣고 한두 시간 절였다가 물을 넣고 간을 맞춰 먹되 식초를 많이 넣는다. 창국 중에제일 좋다.” 세대는 바뀌어도 입맛은 변하지 않나 보다.
보양식 삼계탕
음식을 통해 몸을 보하는 보양식은 기력이 소진하기 쉬운 여름철 건강 지킴이다. 사시사철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즐겨 먹는 오늘날에야 보양식을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우나, 고깃국 한 그릇이 귀하던 시대에는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보양식을 즐겼다. 궁중에서는 여름 보양 음식의 하나로 임자수탕(荏子水湯)을 수라에 올렸다. 임자는 흰 참깨를 가리키는데,옛 기록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깨를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임자수탕은 적은 양을 먹어도 많은 열량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소화도 잘되는 깨를 갈아 만든 냉국이다. 그래서 깻국탕이라고도한다. 과정은 정성 그 자체다. 푹 곤 닭을 건더기와 함께 짜서 육수를 내고, 볶은 흰깨에 물을 부어가며 으깨 깨즙을 짜서 육수와 섞는다. 그런 다음 차갑게 식혀 소금으로 간하고 오이채와 지단을 고명으로 얹는다. 혹은 닭고기 살과 고기완자, 오이, 표고 등을 함께 넣어 든든하게 먹기도 하고, 삶은 전복이나 해삼을 저며 특별하게 즐기기도 한다.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는 “밀로 국수를 만들어 청채(靑菜)와 닭고기를 섞고 백마자탕(白麻子湯)에 말아 먹는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백마자는 흰깨를 칭하는 것으로, 깻국탕에 면을 넣어 먹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닭고기는 몸에 열을 내 보양 효과를 일으키는 여름철 대표 식재료이자 ‘국민 보양식’ 삼계탕의 주재료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삼계탕은 일제강점기에 닭국에 가루 형태의 인삼을 넣어 먹던 데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계탕의 본래 이름은 계삼탕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대중에게 판매되면서 인삼 가루로 맛을 낸 닭국보다는 계삼탕이라는 이름이 그럴듯한 메뉴다워서다. 1960년대에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뀐다. 1960년대 들어 국가 차원의 양계업 진흥 덕분에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인삼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편 셈이다. 오늘날 같은 삼계탕 전문점은 1970년대 이르러서야 생겼다.
삼계탕만 놓고 보면 역사가 짧지만, 우리 선조는 삼계탕과 유사한 음식을 이미 즐기고 있었다. ‘닭백숙’류의 음식은 1670년경 자료에도 등장하고, 닭을 활용한 국물요리인 총계탕, 황계탕 같은 탕류는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요리제법>(1917)에는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뱃속에 찹쌀 세 숟가락과 인삼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끓인다”는 닭국 요리법이 나와 있다. 삼계탕과 다른 듯 닮은 음식도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의 별미인 초계탕은 요즘에 이르러서 여름 보양식으로 각광받는다. 이북 음식인 만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즐겨 먹던 향토 음식으로, 특히 파주가 유명하다. 식초와 겨자로 간을 맞춰 톡 쏘는 새콤함과 깔끔하고 시원한 닭 육수 맛이 일품인 초계탕은 잘게 찢은 닭 살코기와 각종 채소 고명을 넣어 든든한 한 끼로 손색없다. 과거 잔칫날에야 먹을 수 있었던 특별 음식으로,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에도 등장한다.
여름별미 콩국수
콩은 예부터 서민의 요긴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특히 여름 별미로 콩국수를 즐겼다. 정확히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00년대 말에 나온 <시의전서>에 콩국수와 깨국수가 기록된 점으로 미뤄 꽤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임을 짐작할 뿐이다. 책에서는 “콩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살짝 데쳐서 가는 체에 내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밀국수를 말고 그 위에 채소 채 친 것을 얹는다”고 적혀 있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콩국수를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탕수육의 ‘부먹 vs 찍먹’뒤를 이어 콩국수의 간을 소금으로 하느냐, 설탕으로 하느냐가 논쟁의 요지다.
소금파는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달게 먹는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설탕파는 달콤한 콩물 맛도 모르는 소금파를 비웃는다. 주로 호남이 설탕을, 영남을 포함한 그 외 지역에서 소금을 선호한다. 호남의 여름 음식 중 ‘설탕 국수’도 눈에 띈다. 시원한 보리차나 얼음 동동 띄운 생수에 설탕과 소면을 말아 먹는 것으로, 설탕이 귀하던 시절 손님을 대접하던 음식에서 점차 호남 지역 별미로 거듭났다. 서민이 콩국수로 여름을 났다면, 궁중이나 반가에서는 잣국수를 즐겼다. 잣은 예부터 원기 회복에 탁월한 귀한 견과류였다. 잣을 곱게 간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는 잣국수는 경기도 향토 음식으로, 그중 잣 생산량이 전국 70%를 차지하는 가평이 유명하다. 꼬순 국물을 연거푸 들이켜다 슬쩍 느끼해질 즈음,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잣 특유의 느끼함 없이 잣국수 한 그릇을 끝까지 비워낼 수 있다.
단맛 좋은 여름 과일
제철 과일이란 말이 무색해진 요즘이지만, 햇빛을 토실 토실하게 먹고 자란 여름 과일은 유달리 달다. 아니, 정확히는 개량을 거치면서 당도가 월등히 높은 신상 여름 과일이 많아졌다. 과일의 단맛 열풍을 이끈 선두 주자 격인 샤인머스캣은 일반 포도보다 훨씬 달아 당도가 17~22브릭스(Brix)에 이른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맛은 물론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간편하기까지 하다. 초창기엔 샤인머스캣 씹는 소리를 들려주는 ASMR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포도가 들어온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 고려시대 이전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경제>를 통해 조선시대에 여러 품종의 포도가 재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토마토는 새콤함이 주를 이루는 찰토마토, 대저토마토, 방울 토마토에 이어 설탕을 뿌린 듯 달콤한 스테비아 토마토 양강 구도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당도가 일반 설탕의 200~300배인 스테비아를 땅에 뿌려 토마토 뿌리로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재배한다.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는 단맛은 높지만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열량은 일반토마토와 다름없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겉모양은 천도 복숭아처럼 생겼으나 과육은 말랑한 백도복숭아를 닮은 신비복숭아 역시 높은 당도로 사랑받는다. 맛도 맛이지만 천도복숭아에 비해 매우 소량 생산돼 쉽게 맛볼 수 없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갈증 해소에 탁월한 수박은 ‘미니’ 사이즈가 인기다. 처치 곤란일 때가 많은 큰 수박 대신 1~2인이 먹어도 부담 없는 크기가 대세다. 껍질이 얇고 사과처럼 아담한 애플수박, 까만 껍질 속 과육이 노란색을 띠는 블랙망고수박과 이보다 더 작은 까망애플망고수박 등 종류도 다양하다. 요즘엔 수박 구입 후 일정 금액을 내면 손질·포장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소비자의 호응이 높다. 오로지 여름 한철, 그것도 5월 중순부터 7월까지만 맛보는 초당옥수수 역시 놓칠 수 없는 여름 간식이다. 쫀득쫀득한 찰옥수수와 달리 당도가 높고, 녹말 함량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톡톡 터지는 아삭아삭한 식감은 이색적이다 못해 매력적이다. 특히 삶지 않고 생으로 섭취했을 때 달큼한 맛과 식감이 배가된다. 이 맛을 잊지 못 해 매년 여름이 돌아오길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다.
-김정현기자